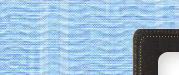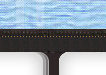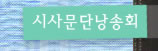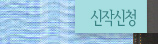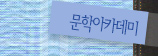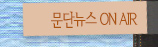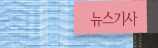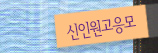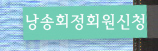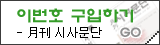도랑물 따라 오는 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은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64회 작성일 2003-02-05 14:24본문
겨울의 싸늘한 공기는 뒤뜰을 돌아 나와 마당을 한 바퀴 휑하니 돌았다. 그리곤 마당가운데 긴 그림자를 밟고 서 있는 바지랑대 위에 걸쳐있는 햇살 위에 살짝 내려앉는다. 망중한(忙中閑)이라고 했나?, 명절이라서 들고나는 친지들의 분부함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서 집 뒤 작은 도랑에 나가 보았다. 감나무 밑에 쌓여 있던 눈 위에는 아직까지 그 누구의 발자국도 없다. 오랜 동안 쌓여 있어 단단해진 눈 위에 첫 흔적을 남기며 도랑으로 내려섰다. 여름 소낙비에 황톳물을 토해 내며 간간이 자연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마른풀들을 품에 안고 두껍게 덮여 있던 어름이 군데군데 녹아 있어 맑고 투명한 속살을 보이며 쫄쫄쫄 소리를 내고 흐른다. 작은 막대기 하나를 주워들고 쭈그리고 앉아 톡~톡~톡 두들겨 봤다. 쨍하고 맑은 소리 대신에 둔탁한 소리가 들려 온다. 두툼하게 얼어 있는 곳을 한 발로 쿵쿵 굴러 보지만 쉽사리 깨지지 않는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겹겹이 단단히 얼어 있다. 그 견고한 얼음장 밑으로 들려오는 청량한 소라와 멈춘 듯 흐르는 도랑물은 유년의 산책길을 따라 흐른다.
겨울과 봄의 터널 같은 이 즈음쯤 산등성엔 아직도 흰 모자 눌러 쓰고, 음지쪽 잔 설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날. 도랑
가로 가제 잡으러 노란 양은 주전자 들고 아이들과 골짜기를 찾아갔었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썩이면 추위에 놀란 가제는
웅크리고 있다간 이내 우리의 손에 잡혀 세상구경을 했다. 그렇게 흐르는 도랑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숙한 골
짜기에 가 있고, 주전자 속에 고물고물한 가제들은 반쯤 들어차 있으며, 발은 이미 물에 젖어있다. 손 또한 벌겋게 얼어
시린 감각마저 희미해 질 때쯤 친구들과 의기 양양하게 돌아오는 길, 도랑 가에 뿌리 적시고 살아가는 버들강아지를 한
줌 꺾는다. 뽀송하게 살이 오른 봉오리로 봄꿈을 키우던 물이 덜오른 손에 들려진 버들강아지를 따라 유년의 봄은 마을
로 내려왔다.
마을에 내려온 봄은 양지바른 담 모퉁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비석 치기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갈라진 손등에서부터 시
작된다. 처마 밑에 매달려 겨우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며 허황된 꿈을 키웠던 고드름이 고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 얼
었던 땅들은 성자의 흡족해진 가슴이 된다. 얼었던 마음이 녹듯 결빙된 땅들의 질척거림으로 신발 밑에 달라붙던 흙덩이
에서도 봄이 왔다. 밟을 수록 신발 가득 묻어나는 진흙처럼 우리네 삶의 부산물도 살아 갈 수록 자꾸만 늘어붙어 다닌다
는 것을 몰랐던 그 때, 어린 날의 봄은 빛깔보다는 바람으로 먼저 왔다. 부드러움 속에 칼날을 숨긴 미소는 어린 손등을
갈라놓는 생채기를 내며, 겨울잠 즐기는 개구리를 깨워 하품을 토해내게 하는 짖궂은 심술에서부터 시작되던 봄이다. 그
런 봄맞이 속에서 보았던 버들강아지가 뽀시시 미소 짖고 있는 도랑가에 잔잔히 흐르는 물 따라 유년의 봄 길을 더듬으
며 지난여름 주렁주렁 어르신들의 꿈을 달았던 포도밭에를 가봤다.
잎새 하나 남기지 않은 나목으로도 모자라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한 겹 더 마른 가지를 벗겨내고 있는 포도나무
가녀린 가지가 안쓰럽다. 봄이면 제 팔 다리 잘려나갈 운명도 모르는 체 저 가녀린 가지에서도 꿈은 꾸고 있을 텐데...그
앙상한 팔목을 붙잡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름 모를 홀씨주머니를 보았다. 홀씨주머니 속에는 하늘로 날지 못한
천사의 날개 같은 옷자락에 매달린 검은 씨앗하나 꿈을 접고 들어 있었다. 꼬투리 하나를 따서 손끝으로 헤집어 보았다.
고이고이 접혔던 꿈들이 줄줄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다. 회색빛 하늘에 분홍색 꿈을 꾸며 마른 땅, 아직은 얼어붙은 땅
위에 생명하나 남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날아오른 홀씨들을 보며 우리 집 작은 스티로폼 상자 속에 푸른 생명으로 싹을 틔운 수선화
잎새를 생각한다. 작년 봄, 너무도 화사한 햇살 아래 알 수 없는 우울(憂鬱), 반복되는 두통과 미열에 시달려 무력감에
빠져 삶의 의미마저 퇴색해 지던 날, 나로 인하여 너무도 침체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었다. 그러나 그 처음의 신선함도 오래 가지 못하고 꽃은 시들고, 잎은 누렇게 변하여 식탁에 올려
지는 영광은 끝이 나고 베란다로 밀려났던 화분이다. 한번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닌 여러해살이 꽃으로 알고 있던 수선화
를 버리지 못하고 알뿌리만 꺼내서 스티로폼 상자에 묻어 두었었다. 그런 작은 뿌리가 지금 힘차게 좁은 땅을 밀고 올라
와 푸른 싹을 키우고 있어 이즘엔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정말이지 자연의 생명력이란 참으로 위대하다. 그 작은 뿌리
속, 보이지 않은 힘으로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강인함에 감탄하면서 올해는 노란 소망하나 피워 올리길 빌어 본다. 아
니 지금 그 작은 소망이 식탁 위에서 웃고 있는 듯 하다.
날려보낸 홀씨들이 하늘 가득 꿈을 펼친다.
푸른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아름다운 비행이다.
홀씨 속에 내 꿈 하나 싣어 보낸다. 마른 가지에 물오르고, 고목에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내 일상의 작은 일들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고...
겨울과 봄의 터널 같은 이 즈음쯤 산등성엔 아직도 흰 모자 눌러 쓰고, 음지쪽 잔 설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날. 도랑
가로 가제 잡으러 노란 양은 주전자 들고 아이들과 골짜기를 찾아갔었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썩이면 추위에 놀란 가제는
웅크리고 있다간 이내 우리의 손에 잡혀 세상구경을 했다. 그렇게 흐르는 도랑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숙한 골
짜기에 가 있고, 주전자 속에 고물고물한 가제들은 반쯤 들어차 있으며, 발은 이미 물에 젖어있다. 손 또한 벌겋게 얼어
시린 감각마저 희미해 질 때쯤 친구들과 의기 양양하게 돌아오는 길, 도랑 가에 뿌리 적시고 살아가는 버들강아지를 한
줌 꺾는다. 뽀송하게 살이 오른 봉오리로 봄꿈을 키우던 물이 덜오른 손에 들려진 버들강아지를 따라 유년의 봄은 마을
로 내려왔다.
마을에 내려온 봄은 양지바른 담 모퉁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비석 치기하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갈라진 손등에서부터 시
작된다. 처마 밑에 매달려 겨우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며 허황된 꿈을 키웠던 고드름이 고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 얼
었던 땅들은 성자의 흡족해진 가슴이 된다. 얼었던 마음이 녹듯 결빙된 땅들의 질척거림으로 신발 밑에 달라붙던 흙덩이
에서도 봄이 왔다. 밟을 수록 신발 가득 묻어나는 진흙처럼 우리네 삶의 부산물도 살아 갈 수록 자꾸만 늘어붙어 다닌다
는 것을 몰랐던 그 때, 어린 날의 봄은 빛깔보다는 바람으로 먼저 왔다. 부드러움 속에 칼날을 숨긴 미소는 어린 손등을
갈라놓는 생채기를 내며, 겨울잠 즐기는 개구리를 깨워 하품을 토해내게 하는 짖궂은 심술에서부터 시작되던 봄이다. 그
런 봄맞이 속에서 보았던 버들강아지가 뽀시시 미소 짖고 있는 도랑가에 잔잔히 흐르는 물 따라 유년의 봄 길을 더듬으
며 지난여름 주렁주렁 어르신들의 꿈을 달았던 포도밭에를 가봤다.
잎새 하나 남기지 않은 나목으로도 모자라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한 겹 더 마른 가지를 벗겨내고 있는 포도나무
가녀린 가지가 안쓰럽다. 봄이면 제 팔 다리 잘려나갈 운명도 모르는 체 저 가녀린 가지에서도 꿈은 꾸고 있을 텐데...그
앙상한 팔목을 붙잡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름 모를 홀씨주머니를 보았다. 홀씨주머니 속에는 하늘로 날지 못한
천사의 날개 같은 옷자락에 매달린 검은 씨앗하나 꿈을 접고 들어 있었다. 꼬투리 하나를 따서 손끝으로 헤집어 보았다.
고이고이 접혔던 꿈들이 줄줄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다. 회색빛 하늘에 분홍색 꿈을 꾸며 마른 땅, 아직은 얼어붙은 땅
위에 생명하나 남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날아오른 홀씨들을 보며 우리 집 작은 스티로폼 상자 속에 푸른 생명으로 싹을 틔운 수선화
잎새를 생각한다. 작년 봄, 너무도 화사한 햇살 아래 알 수 없는 우울(憂鬱), 반복되는 두통과 미열에 시달려 무력감에
빠져 삶의 의미마저 퇴색해 지던 날, 나로 인하여 너무도 침체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었다. 그러나 그 처음의 신선함도 오래 가지 못하고 꽃은 시들고, 잎은 누렇게 변하여 식탁에 올려
지는 영광은 끝이 나고 베란다로 밀려났던 화분이다. 한번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닌 여러해살이 꽃으로 알고 있던 수선화
를 버리지 못하고 알뿌리만 꺼내서 스티로폼 상자에 묻어 두었었다. 그런 작은 뿌리가 지금 힘차게 좁은 땅을 밀고 올라
와 푸른 싹을 키우고 있어 이즘엔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정말이지 자연의 생명력이란 참으로 위대하다. 그 작은 뿌리
속, 보이지 않은 힘으로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강인함에 감탄하면서 올해는 노란 소망하나 피워 올리길 빌어 본다. 아
니 지금 그 작은 소망이 식탁 위에서 웃고 있는 듯 하다.
날려보낸 홀씨들이 하늘 가득 꿈을 펼친다.
푸른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아름다운 비행이다.
홀씨 속에 내 꿈 하나 싣어 보낸다. 마른 가지에 물오르고, 고목에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내 일상의 작은 일들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