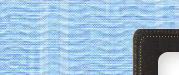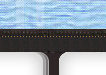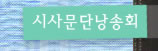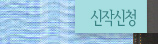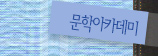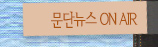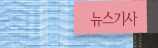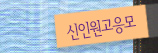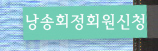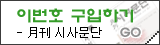상반된 대립, 그 황홀한 수용/안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법문 박태원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 댓글 3건
조회 2,550회
작성일 2007-06-06 23:11
) 댓글 3건
조회 2,550회
작성일 2007-06-06 23:11
본문
상반된 대립, 그 황홀한 수용
― 기독교ㆍ유가ㆍ도가ㆍ불가의 사유 형식 ―
안수환
<천안연암대학 교수>
1.
시는 느낌(즉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즉 머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느낌은 동물적 차원(즉 귀여운 강아지)인 반면, 생각은 인간적 차원(즉 아름다운 인품)인 까닭에서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 표현의 바탕에는 문법이 깔려 있게 마련이다. 문법이란 무엇인가? 좁게는 언어 체계의 ‘질서’를 두고 하는 말이며, 넓게는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의 ‘방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신은 그러므로 언어체계의 발현(즉 표현)일 뿐이다.
시인이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언어는 ‘의미’의 물줄기를 탄다. 음악일지라도 그것은 일정한(혹은 일반적인) 의미의 집합을 통해 표현되는 것. 그림일지라도, 건축일지라도, 돌 한 덩어리, 찢어진 나뭇잎일지라도 언어는 ‘의미’의 물줄기를 타고 흐르다가, 흐르다가 ‘관념(즉 개념)’이 된다. 명사의 방향이 그와 같은 모양을 드러낸다는 것. 명사는 사물(즉 대상)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 넓게 말한다면 언어는 곧 ‘이름 붙이기’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시는 무엇인가? ‘이름 붙이기’일 뿐. 핵심은 이름 붙이기에 있었던 것.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인가? 명사를 사용할 것. 그러나 이런 경우, 모든 명사는 개념(즉 관념)의 전조(前兆)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 그 다음에는 동사를 사용할 것. 그러나 이런 경우 모든 동사는 개념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개념이란 명사가 일반화되고, 동사(즉 관계)가 추상화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가령, 명사에 관한 말 한 마디:
맨드라미는 꽃이다
‘맨드라미’(즉 요소)를 일반화하면 ‘꽃’(즉 요원)이라는 집합이 된다. ‘나는 시인이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요소가 ‘나는 ’이라는 요원이 되어 ‘시인’이라는 집합 명사의 또 다른 요원과 만나 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 문장의 기본단위는 요소와 요원이었던 것. 요소를 일반화하면, 그러므로 집합이 된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은 마침내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동사의 도움을 받아 우주를 들여다보는 시로 몸을 바꾸게 되는 것. 시인은 시를 쓴다. 그는 나뭇잎 위에 떨어진 북극성을 본다.
시에 있어서의 이름이란, 이름의 이름 [(이름)2]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는 넷으로 규명할 수 있다. 즉 갈라지고(-), 나뉘고(÷), 섞이며(×),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름은 어디서나(즉 공간), 언제든지(즉 시간) 변수(×)인 것. ‘그렇다’의 변수(×)는 ‘그렇지 않다’의 변수(∼×)와 한 쌍이 되어 대립될 때 이원이차(二元二次)[(×)2ㆍ(∼×)2]의 생각을 낳는다. 명사는 공간의 확대로, 동사는 시간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생각은 대립을 전제로 하여 태어나는 ‘이름 붙이기’인 것. 대립(즉 대칭)이 소멸되면, 생각이 또한 소멸된다. 의식의 준거는, 사실상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미분화의 초월적 관념―그것을 우리는 ‘신화’(11+1=12=1)라고 달리 이름 붙여도 좋을 것이다―을 객관화(즉 이분화)함으로써 일정한 의식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 그렇더라도 관념의 변화를 따라잡는 의식의 흐름은 넓다. 하늘(즉 자연 혹은 신)의 붕괴를 떠받친 인간의 주관은, 그러기에 저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체계의 근거를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현실의 문제는 복잡다단하다. 그에 대한 시인들의 눈물겨운 싸움을 들여다보자. 유홍준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저수지에 간다
밤이 되면 붕어가 주둥이로
보름달을 툭 툭 밀며 노는 저수지에 간다
요즈음의 내 낙은
홀로
저수지 둑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아무 돌멩이나 하나 주워 멀리 던져보는 것
돌을 던져도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는 저수지의 웃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긴 한숨을 내뱉어 보는 것이다
알겠다 저수지는
돌을 던져 괴롭혀도 웃는다 일평생 물로 웃기만 한다
생전에 후련하게 터지기는 글러먹은 둑, 내 가슴팍도 웃는다
― 〈저수지는 웃는다〉 전문
‘돌’과 ‘물’의 대칭. 시인은, 저수지 둑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저수지(그곳은 ‘밤이 되면 붕어가 주둥이로 / 보름달을 툭 툭 밀며 노는’ 지락의 처소였던 것)의 물 속으로 멀리 던진다.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은, 그런데 이때 무너진다.
저수지의 둑에 놓여 있던 돌멩이는 지금 / 이곳으로서의 구체적인 현실(즉 현존) 속에서 시인의 가슴팍에 박힌 ‘돌’로 전이되고 있었던 것. ‘돌’(즉 괴로움)과 ‘물’(즉 즐거움)의 표상은 표면적으로는 대칭인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시인의 뮈토스(Mythos:)로서의 역행을 눈 여겨 볼 때 그것은 대립이 아닌 긍정으로서의 개안이었던 것. 괴로움(그것은 삶의 모순율일 것이지만)을 씻는 힘은 시적 대상들에 대한 의식의 변형(즉 사물의 자발성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불꽃)에 있으며, 이곳에서 그는 스스로 ‘아프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천천히 그 아픔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 아픔이 비본질이라는 사실을, 유홍준은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미토스(mythos)- 고전(古典) 그리스어에서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에서는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 극의 줄거리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미토스에서 떠나 로고스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표현하기 곤란한 것을 기술하기 위해(소크라테스 이전), 논리적 사색을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플라톤) 미토스의 비유적 ·직관적 표현을 자주 이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토스와 로고스를 구별하였는데, 철학은 경이(驚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미토스도 불가사의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스를 사랑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자라고 하였다(형이상학).
근세의 낭만주의 철학, 특히 F.W.셸링이나 F.W.니체는 미토스를 비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재평가하였다.
2.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노자(老子)》, 1장).
상무욕이관기묘(常無欲以觀其妙)
상유욕이관기요(常有欲以觀其요) [요:구할,경계 요]
이곳의 ‘상(常)’이란 시간의 항상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항상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無)’와 ‘유(有)’, ‘묘(妙)’와 ‘요(흯)’의 대립. 시간은 이 대립을 무너뜨린다. 시간은 바뀌는 것.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바뀌는 전화(轉化)의 틈인 것. 시간이 공간을 차지할 때 그 전화는 전위(轉位)로 바뀌는 것. 앞의 문맥은, 욕망이 ‘없으면’ 묘함을 보게 되고, 욕망이 ‘있으면’ 경계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조건의 대립인 것. 그 둘은 같은 것 [此兩者同]이다. 인지활동에서 나온 뒤 그 둘은 이름을 달리한 것[出而異名]일 뿐이다. 같음은 아득함이며[同謂之玄], 아득함이 또 아득하여[玄之又玄], 모든 아득함의 문이 될[衆妙之門] 따름이다. 상위적(相位的) 개념으로서의 ‘가(可)’와 ‘비(非)’도 또한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대립인 것. 유무상생 난이상성(有無相生 難易相成)(《노자(老子)》, 2장)이 또한 그렇다는 말이다. 상반된 개념의 전위였던 것.
대칭은 언제든지 둘이 한 쌍이 되어 태어난다. 가령 ‘꽃’을 꽃으로 본다면, 그것은 꽃 ‘아닌’쪽의 꽃을 포함한 것(꽃⊃꽃)이라는 것. 최고의 덕은 덕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上德不德, 是以有德], 부족한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덕이 없다고[下德不失德, 是以無德](《노자》, 38장) 하는 것이다. 노자는 대립을 무너뜨렸다. 나는 착한 것을 착하게 보고, 착하지 않은 것을 또한 착하게 본다.
그것이 ‘큰’ 착함인[善者 吾善之, 不善者 吾亦善之, 德善](《노자》, 49장) 것이다. 노자는 ‘유(有)’와 ‘무(無)’의 대칭을 무너뜨렸다. 천하만물은 유에서 살아가고, 유는 무에서 살아 남는다[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노자》, 40장). 있고(有) 없음(無)의 차별을 관통하는, 이른바 상위소통의 모순율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모순율에 뿌리를 내린 역설 패러독스(paradox). 이 역설은 기독교의 사유체계의 전형이었던 것. 예수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5세기 칼케돈 총회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
그와는 달리 공자의 사유체계 [(×)2]는 (×)가 (×)나름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중화의 논리구조를 드러냈던 것. ‘그것’이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다워야 한다 [(×)2]는 것.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의 의표가 그것이었다.
공자와 노자가 보여 주는 이러한 사유형식이란, 그것들의 문맥 속에는 언제든지 이원이차적(二元二次的)인 [22=4] 논리의 요원(즉 명사: 모든 명사는 개념으로 발전한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요약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거듭된’ 부정을 통해[∼(∼(∼×)] 비로소 ‘그것’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노자의 ‘명(名)’은 ‘그것(×)’을 부정하는(∼×) 단순한 대립으로의 대칭이 아니라 이원이차적인 사유의 틀(22=4)을 건너온 이름이었던 것이다[名可名 非常名 《노자》, 1장].
의미의 홑겹을 입고 떠오른 의미일지라도 그것은 그토록 결곡한 의미와의 싸움으로부터 돌아온 착상이라고 할 때, 그 착상이야말로 얼마나 황홀한 숨결을 달고 있는 것이랴. 숨결마저도 실은 불고[呼] 마심[吸]으로의 ‘상반된’ 두 측면의 통합이라는 사실. 이쪽과 저쪽은 서로 관통한다.
시인의 의식. 의식의 흐름이 어떠한 것이든, 시는 사물의 움직이는 규범(즉 조건)에 대한 순기능이라는 점에서 사물 본래의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부조리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물 쪽과 상관없이 시인의 주관, 즉 그 주관을 감싸고 있는 자발성으로서의 표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논리가 초월적 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시는 사물에 대한 시인 자신의 합리화(즉 위안)라는 점에서, 그 사물과의 일시적인(혹은, 영속적인) 간격을 인출해 내는 인식인 것. 그곳에서 그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마음의 평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희노애락의 감정에 사로잡힌 갈등의 문제였던 것. 현실에 대한 감지자의 주체적인 감응은 그토록 먼(혹은 두꺼운) 양감(量感)의 간격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 양감이란 객관화의 표상. 희노애락마저도 객관화의 표상을 통해 시인에게 감지되었던 것. 질감(質感)의 객관화[莫見乎隱, 莫顯乎微. 《중용(中庸)》, 1장]의 사유의 틀이 또한 그러했던 것. 숨기는[隱] 것보다 더 보이는 것은 없고, 극미한[微]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뜻. 이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근거를 ‘대립’에 두고 있는 말이다. 대립을 세우는 쪽은 공간이었으며, 그 대립을 허문 쪽은 시간이었던 것. 의식은 시간의 확장 혹은 수축을 재빨리 알아챈다.
그러므로 의식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변화의 비율일 따름이었다. 그렇더라도 시는 의식의 확보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시인(즉 주체)은 현실(즉 대상)과의 시중적(時中的)인 합일 혹은 분리를 통해 행복한(혹은 불행한) 감응에 휩싸일 뿐 아니라 말없는 침묵과의 접촉을 통해 ‘상분(相分)’의 논리 그 자체마저도 벗겨 낸다. 한 조각의 나뭇잎 위에 제 마음을 놓아 둔다. 그의 나뭇잎은 의식의 부호가 아니었다. 박찬일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봄이다 푸른 함박눈이 쏟아진다
하느님의 긴 은총이시다
나도 언제 함박눈으로 갚으리라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늘로 쏟아지리라
여러 색깔이 있다 푸른 함박눈이 있다
어떤 색깔로 쏟을까
나는 현재 즐거운 비명으로 산다
하느님은 죽는 걸 좋아하신다
― 〈함박눈〉 전문
‘이것 저것’ 혹은 ‘삶 죽음’이라는 상분의 논리를 앞세우고 쓰여진 시. 박찬일의 ‘하느님’은 ‘함박눈’이었다. 막연하고도 모호하게 다가오는‘하느님’의 초상(즉 상상의 각질)을 더 이상 갈등·모순·대립과도 같은 결정론적인 불가해의 표상으로 남겨둘 수 없었던 것. 초월마저도 개념이었던 그의 인식은 철저하게 해명되어야 했다. ‘예술 예술미 예술 작품’의 담론 속에 가라앉은 세계의 총체성(그것을 시인은 지금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혹은 상상의 개념으로 숙달된 존재 이해의 합목적성(다른 말로는 절대 신앙의 정신적 표상)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어투는 정신의 율법을 내려놓은 듯이 난폭해졌다(‘하느님은 죽는 걸 좋아하신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의 ‘하느님’은 감각, 즉 미의 이념으로 규정된 형식(즉 자연의 합목적성) 그것까지도 부정한 단순한 숨결(‘봄이다 푸른 함박눈이 쏟아진다’)과 제휴했던 것. 시인은 말한다. 삶에는 ‘여러 색깔이 있다’ ‘푸른 함박눈이 있다’는 것. 한쪽은 다른 쪽의 ‘남은’ 양쪽이었던 것. 물아(物我)·피차(彼此)·생사(生死)의 대립을 넘은 현존(‘나는 현재 즐거운 비명으로 산다’)에 대한 사유 형식이 그의 문맥을 관통한다.
‘죽는 걸 좋아하시는’ 하느님일지라도 생사의 대칭은 결국 ‘푸른 함박눈이 쏟아지는’ 이승의 색깔 안에 있었던 것. 눈에 보이는 자연(즉 ‘푸른 함박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정신의 실현(즉 ‘혼신의 힘’), 그 두 영역을 그는 하나로 봉합해 놓았던 것. 진리는 진리일수록 그의 적대였다. 시인의 상상은 ‘현존하는’ 사물의 형태를 정신에 연결시킴으로써 진리의 자발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묻고 있었던 것.
진리일지라도 그것들은 상상의 형태를 입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내면화된 종교적 상상의 관습이 그의 시의 적수였던 것이다. 시적 표현의 표면이 아닌 이상,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성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키는 꿈이었던 것.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찬일 시의 사물의 형태는 그의 삶의 실제 깊이보다도 훨씬 깊었던 것. 가령, 어떤 신이 끝끝내 영험하려고만 한다면 그 신은 곧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神無以靈, 將恐歇. 《노자》, 39장]. 그의 시에 있어서는 신은 헐값이어도 좋았던 것이다.
3.
‘나’를 나라고 인정하면 ‘아상(我相)’에 빠진다. ‘너’를 너라고 인정하면 ‘인상(人相)’에 빠진다. ‘그’를 그라고 인정하면 ‘중생상(衆生相)’에 빠진다. ‘영원’을 영원이라고 인정하면 ‘수자상(壽者相)’에 빠진다. 《금강경(金剛經)》에 나오는 사상(四相)에 관한 석가의 가르침이다.
이 경우의 ‘상(相)’은 ‘색(色)’이며, ‘색(色)’으로서의 명사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가변적인 변수(×)의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래(如來)의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가(可)’와 ‘비(非)’의 속령에 갇힌 패러다임일 뿐이다. ‘가(可)’는 ‘가(可)’로서 머물지 않고 언제나 그것의 대칭인 ‘비(非)’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심물일원(心物一元)의 진정한 ‘공(空)’을 꿈꾸는 입장에서는, 명사와 동사로 변주되는 먼지의 이동[色·聲·香·味·觸·法·空]에 집착하지 않는다. 먼지는 이동한다(즉 변화한다). 《금강경》 제13품에서 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보리. 제미진, 여래설비미진, 시명미진. 여래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여래는, 모든 먼지를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먼지이며,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라[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卽非菩薩. 《금강경》, 제17품]는 것. 청정의 세계. 그러나 그 청정의 일면에 집착하게 된다면, 일면은 ‘단순한’ 이름일 뿐이므로 그것이 번뇌의 뿌리라는 것이다.
‘먼지’를 먼지라고 부르는 이름. 번뇌가 보리(菩提)라는 역설은 이곳에서 나온다. 변수(×)는 역설의 변역(變域)을 낳았고[그것은 ‘참’이며, 동시에 ‘거짓’이다: ∼(p∼p)], 수대(隋代)의 길장(吉藏, 549∼623)에 이르러서는 이원삼차의 사유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길장의 이제상즉론(二諦相卽論): 첫째 마디는 ‘유(有)’와 ‘무(無)’의 양립, 둘째 마디는 ‘유·무’와 ‘∼유·∼무’의 병립, 셋째 마디는 ‘유·무’와 ‘∼유·∼무’와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의 연립으로 나타나며, 이 단계를 모두 밟으면 16마디[23+1=24=16]로 포개진다. 의식의 대상, 즉 이름은 ‘진(眞)’이 아니므로 ‘비이비불이’의 마지막 단계를 넘은 다음에라야 비로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편비중(非遍非中)의 평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유’(×)의 이중부정(∼(∼×))인 ‘비이(非二)’와 ‘무’의 이중부정(∼(∼(∼×))인 ‘비불이(非不二)’는 결국 ‘유’와 ‘무’의 대립에 그 뿌리를 두었던 것. 이중부정은 긍정이었던 것. 번뇌가 보리라는 역설은 바로 이 대긍정, 즉 공간 전체를 둘(二)로 나누는 부정(∼×)에 의한 이분화였던 것.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서랴[法尙應捨, 何況非法, 《금강경》, 제6품]. 이 대긍정은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所謂佛法者, 卽非佛法, 《금강경》, 제8품]라는 말을 낳기에 이른다. 대긍정은 언제나 ‘그것’(×)이 ‘그렇다’(可)로부터 ‘그렇지 않다’(非)로 전이되는, 말하자면 부정에 의한 이분화의 끝에 있었던 것이다.
공간의 이분화가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간의 이분화는 시간의 부정(∼×), 즉 시간의 소멸로 이어지는 재분화로 모든 의식이 끊어지게 된다. 망각의 망각이 그것이다. ‘그것’(×)을 망각한(쬎) 것(쬎·(×))조차 다시 망각해 버림(쬎·(쬎·(×)))으로써 모든 집착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色)은 그것의 반대편 저쪽에 ‘저것’(저것 또한 ‘다른’ 색일 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망각’(空)이 붙어 있었던 것. ‘그것’의 또 다른 ‘저것’은 ‘그것’의 상위적 대립이 아닌 미몽에 불과했던 것.
상위적 대립의 황홀한 불꽃.‘유’(즉 ‘色’)와 ‘무’(즉 ‘空’)를 한꺼번에 끌어안고,‘가(可)’(즉 ‘그렇다’)와 ‘비(非)’(즉 ‘그렇지 않다’)를 한꺼번에 끌어안을 때, 그때가 여여(如如)한 시간이라는 것. 따지고 보면, 본 모습이란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그것’이 본 모습이었던 것. 본 모습으로서의 ‘그것’은, 그것이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점에서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숨결을 달고 있는 것이었다.(이 글의 변수의 변역(變域)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은 나의 스승 한태동 박사의 《사유의 흐름》(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에 전거한 것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도가의 무명론(無名論)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취관지, 인기소연이연지, 즉만물막불연, 인기소비이비지, 즉만물막불비(以趣觀之, 因其所然而然之, 則萬物莫不然, 因其所非而非之, 則萬物莫不非) [趣:뜻, 마음 갈 취]
― 《장자(莊子)》, 〈추수(秋水)〉
이는 ‘형명(形名)’의 기능을 더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정한 의취로 바라볼 때, 무엇을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에 그렇지 않은 것은 없고, 무엇을 그렇지 않게 봄으로써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물에 그렇지 아니함이 아닌 것도 없다는 것. 객관은 모르는 ‘그것’일 뿐이다. 이취관지(以趣觀之), 그것이 문제였던 것. 편파(偏頗). 그러기에 장자는 ‘양망(兩忘)’이라는 인식의 궁극을 꿈꾸었던 것. 그의 양망은 형상이 없는 형상, 사물이 아닌 사물의 집합, 즉 미분화의 함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분별의 대립을 넘은 곳에 그의 양망이 있었던 것.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는 결국 뜻이 아닌 소리에 가까워야 하는 것. 음악으로서의. 김백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목련이 돋아나고
산수유가 피어나고
벚꽃이 불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봄이 무서워졌다
겨울이 히말라야 만년설처럼 녹지 않는 마음인 줄 알았더니
눈물을 흘리는 눈사람처럼
시간이 저절로 녹아서 나무들의 뿌리와 줄기로 흘러가더니
희고 노랗고 붉은 횃불을 든
이 모든 꽃들의 혁명이 무서워졌다
그 미묘한 신호와 암시에 중독된 검은 운명의 인생보다도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겨울이면서 봄이면서 여름이면서 가을인 당신
나무이면서 꽃이면서 잎이면서 열매인 당신
꽃들의 환한 시간 속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당신
― 〈횃불〉 전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인은 지금 부처의 눈을 뜨고 있다. 그의 꽃과 나무는 만다라의 꽃과 나무. 시인은 꽃을 보고 흥분한 내막을 이렇게 실토한다: ‘시간이 저절로 녹아서 나무들의 뿌리와 줄기로 흘러가더니’라고. 언제든지 아무 데나 녹아 흐르는 시간은, 그 시간의 일상적인 피투성(被投性) 안에 만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로 인한 두려움(‘무서움’)은 존재의 부담을 촉발시킴으로써 명랑한 기분을 빼앗기 일쑤인 것이다.
김백겸 시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존재의 피투성에 대한 노여움 혹은 두려움을 버리지 않고, 버리기는커녕 적극적인 표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항상 고양된 기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의 수사학적 정감에 나타난 가장 확실한 공적은 세계 내부의 불충분한 존재 형식에 관한 섭섭함 대신 그것과는 다른 어떤 지고자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준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간은, 이상한 일인데, 시간 속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정신의 표상이었던 것. ‘겨울이면서 봄이면서 여름이면서 가을인’ 시간. ‘나무이면서 꽃이면서 잎이면서 열매인’ 공간.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와 같은 시간의 비통속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시선 때문이었다. 통속은 야만이었지만, 본질적인 초월의 계기였던 것. 아름다움은 개념인 동시에 내가 있어야 할 진리의 존재론적 범주였던 것. 시간의 부표를 떠밀고 올라온 ‘당신’은 이때부터 시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달구어 놓는다.
그의 ‘당신’은,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먼지(즉 ‘꽃들의 환한 시간’)로부터 얼굴을 들고 나타난 반야(般若)였던 것. 반야는 반야가 아니었던 것. 김백겸은 지금 그 반야, ‘유(有) 공(空)’을 뛰어넘는 그 반야를 부르고 있었던 것. 그가 말하는 ‘꽃들의 혁명’은 비공비유(非空非有)의 ‘횃불‘로 타오르는 춤이었던 것. 먼지의 춤이었던 것. 그의 말대로라면 그 먼지의 춤이 ‘무서웠던’ 것이다.
4.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유가·도가·불가의 사유 형식에 관한 일별을 통해 침묵의 공간을 꽤나 신명나게 바라보았다. 침묵의 하중은 매우 무거운 것. 나는 어떤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시는 시간(즉 의식)의 확대가 아닌 공간(즉 호흡)의 확대다. 시는 침묵의 공간을 따라간다. 침묵의 공간이란, 안으로는 의식의 지평을 쳐다보는 간격을 두고 하는 말이며, 밖으로는 사물의 지평을 열어 놓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물이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닌 부분에 대한 시인의 명상. 시인은 사물의 지평, 즉 사물의 ‘열린’ 공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시를 쓴다. 사물은 ‘없다’. 사물은 사물 하나하나의 개별로 머물지 않고 언제나 다른 세계의 연관과 더불어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사물성의 깊이(즉 세계이해의 바탕)로 침투한 낱말을 가지고 시인은 시를 쓴다. 이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전(現前)과 부재의 맞물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대응. 침묵. 침묵은 부재로서의 침묵이 아닌 ‘살아 있는’ 현전으로서의 침묵이었던 것. 사물의 지평을 열고 닫는 문턱이었던 것.
침묵의 간격은 비좁지 않았다. 예감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침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전망의 소실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또 다른 지속을 연결하는 도약이라는 점에서 허공을 지운다. 허공은 공간이 아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종교적 상상의 입김에 닿은 권태의 대극(對極)이었던 것. 아무 때나 궁극이었던 것. 궁극이란 ‘지금 여기’로서의 입을 열고 혹은 입을 닫는 주관의 탈자적 지평이었던 것.
대개의 경우, 시인의 관점들 역시 따지고 보면 이 궁극의 문전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눌변이었다. 침묵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시인이 시를 쓸 때, 그는 종교적 상상의 어떤 연관에게도 허리를 구부릴 수 없는 것. 구부려서는 안 되는 것. 바람이 달밤을 그냥 지나가듯이 그는 시를 쓰는 것. 우대식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저인망 그물에 걸린 고래가 죽었다
溺死다
그의 몸에 남은 망사 스타킹 같은 그물자국에서
線에 관한 몇 개의 보고서를 읽는다
倫理學이 아니다
생의 近親인 죽음 앞에서
물에 빠져 죽은 고래에 대한 내 명상이 깊어질 때,
詩에 대해 생각해본 것뿐이다
말(言)의 촘촘한 저인망에 걸려 죽어가는
한 시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진정한 죽음이란
저와 가장 친근한 곳에서 완성되는 법
客死를 면한 고래와 시인
― 〈고래와 시인〉 전문
‘고래가 죽었다’는 것. 죽음은 죽음인데, 고래의 죽음이 익사였다는 것. 물에 빠져 죽은 고래의 죽음은, 그러므로 몹시 부자연스럽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 저와 같은 죽음의 모습을 염두에 둘 때, ‘말의 촘촘한 저인망에 걸린’ 시인의 죽음 그것까지도 실은 익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시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의 원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의 형태에 대한 불안이었던 것이다. 형태가 본색이었던 것. 죽음의 형식이 죽음의 본질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 이러한 관점은 그의 죽음에 대한 명상을 훨씬 진지하게 이끄는 백미라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시인이 꿈꾸는 ‘진정한’ 죽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죽음의 죽음이었던 것. 그 동안은 죽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 죽음을 ‘선(線)’이라고 말한 시인의 암호는 그러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 관한 한 삶의 크기의 역비(逆比, 즉 ‘생의 近親인 죽음’)를 보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까지도 미추의 문제였던 것. 아름답지 않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다. 이쯤 되면, 한 순간의 죽음을 발굴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빛은 종교가 아닌 산술(算術)의 그것일 터.
의미는 사실의 후면에 있었던 것. 그러기에 시는 아직도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객관(사물 자체에 붙어 있는 말)을 건너뛴다. 약속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종교적 상상과 문학이 서로 뒤섞여도 좋은 부분이며, 혹은 의미 효과로 볼 때 상상의 지평을 넓히는 경우, 문학은 종교가 종교를 해체하는 비판적 변증론의 해법에 따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교를 품는 상상은 종교를 버리는 상상보다 늘 비좁기 때문.
지금까지의 상상은 사물의 존재 조건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 시인이 시인인 이상, 그는 상상과 앎의 편차를 달리 숨기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관한 인식론적인 감각은 그것까지도 실은 자신의 삶의 형태를 노후하게 만드는 관습이라는 것. 종교는 늘 부패했던 것. 시인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닌, 공학이었던 것. ■
안수환
현재 천안연암대학 교수. 시집에 《소심한 시간》 외 다수가 있으며 시론집 《우리시 천천히 읽기》 등이 있다.
[유심]
― 기독교ㆍ유가ㆍ도가ㆍ불가의 사유 형식 ―
안수환
<천안연암대학 교수>
1.
시는 느낌(즉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즉 머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느낌은 동물적 차원(즉 귀여운 강아지)인 반면, 생각은 인간적 차원(즉 아름다운 인품)인 까닭에서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 표현의 바탕에는 문법이 깔려 있게 마련이다. 문법이란 무엇인가? 좁게는 언어 체계의 ‘질서’를 두고 하는 말이며, 넓게는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의 ‘방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신은 그러므로 언어체계의 발현(즉 표현)일 뿐이다.
시인이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언어는 ‘의미’의 물줄기를 탄다. 음악일지라도 그것은 일정한(혹은 일반적인) 의미의 집합을 통해 표현되는 것. 그림일지라도, 건축일지라도, 돌 한 덩어리, 찢어진 나뭇잎일지라도 언어는 ‘의미’의 물줄기를 타고 흐르다가, 흐르다가 ‘관념(즉 개념)’이 된다. 명사의 방향이 그와 같은 모양을 드러낸다는 것. 명사는 사물(즉 대상)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 넓게 말한다면 언어는 곧 ‘이름 붙이기’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시는 무엇인가? ‘이름 붙이기’일 뿐. 핵심은 이름 붙이기에 있었던 것.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인가? 명사를 사용할 것. 그러나 이런 경우, 모든 명사는 개념(즉 관념)의 전조(前兆)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 그 다음에는 동사를 사용할 것. 그러나 이런 경우 모든 동사는 개념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개념이란 명사가 일반화되고, 동사(즉 관계)가 추상화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가령, 명사에 관한 말 한 마디:
맨드라미는 꽃이다
‘맨드라미’(즉 요소)를 일반화하면 ‘꽃’(즉 요원)이라는 집합이 된다. ‘나는 시인이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요소가 ‘나는 ’이라는 요원이 되어 ‘시인’이라는 집합 명사의 또 다른 요원과 만나 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 문장의 기본단위는 요소와 요원이었던 것. 요소를 일반화하면, 그러므로 집합이 된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은 마침내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동사의 도움을 받아 우주를 들여다보는 시로 몸을 바꾸게 되는 것. 시인은 시를 쓴다. 그는 나뭇잎 위에 떨어진 북극성을 본다.
시에 있어서의 이름이란, 이름의 이름 [(이름)2]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는 넷으로 규명할 수 있다. 즉 갈라지고(-), 나뉘고(÷), 섞이며(×),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름은 어디서나(즉 공간), 언제든지(즉 시간) 변수(×)인 것. ‘그렇다’의 변수(×)는 ‘그렇지 않다’의 변수(∼×)와 한 쌍이 되어 대립될 때 이원이차(二元二次)[(×)2ㆍ(∼×)2]의 생각을 낳는다. 명사는 공간의 확대로, 동사는 시간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생각은 대립을 전제로 하여 태어나는 ‘이름 붙이기’인 것. 대립(즉 대칭)이 소멸되면, 생각이 또한 소멸된다. 의식의 준거는, 사실상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미분화의 초월적 관념―그것을 우리는 ‘신화’(11+1=12=1)라고 달리 이름 붙여도 좋을 것이다―을 객관화(즉 이분화)함으로써 일정한 의식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 그렇더라도 관념의 변화를 따라잡는 의식의 흐름은 넓다. 하늘(즉 자연 혹은 신)의 붕괴를 떠받친 인간의 주관은, 그러기에 저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체계의 근거를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현실의 문제는 복잡다단하다. 그에 대한 시인들의 눈물겨운 싸움을 들여다보자. 유홍준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저수지에 간다
밤이 되면 붕어가 주둥이로
보름달을 툭 툭 밀며 노는 저수지에 간다
요즈음의 내 낙은
홀로
저수지 둑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아무 돌멩이나 하나 주워 멀리 던져보는 것
돌을 던져도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는 저수지의 웃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긴 한숨을 내뱉어 보는 것이다
알겠다 저수지는
돌을 던져 괴롭혀도 웃는다 일평생 물로 웃기만 한다
생전에 후련하게 터지기는 글러먹은 둑, 내 가슴팍도 웃는다
― 〈저수지는 웃는다〉 전문
‘돌’과 ‘물’의 대칭. 시인은, 저수지 둑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저수지(그곳은 ‘밤이 되면 붕어가 주둥이로 / 보름달을 툭 툭 밀며 노는’ 지락의 처소였던 것)의 물 속으로 멀리 던진다.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은, 그런데 이때 무너진다.
저수지의 둑에 놓여 있던 돌멩이는 지금 / 이곳으로서의 구체적인 현실(즉 현존) 속에서 시인의 가슴팍에 박힌 ‘돌’로 전이되고 있었던 것. ‘돌’(즉 괴로움)과 ‘물’(즉 즐거움)의 표상은 표면적으로는 대칭인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시인의 뮈토스(Mythos:)로서의 역행을 눈 여겨 볼 때 그것은 대립이 아닌 긍정으로서의 개안이었던 것. 괴로움(그것은 삶의 모순율일 것이지만)을 씻는 힘은 시적 대상들에 대한 의식의 변형(즉 사물의 자발성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불꽃)에 있으며, 이곳에서 그는 스스로 ‘아프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천천히 그 아픔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 아픔이 비본질이라는 사실을, 유홍준은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미토스(mythos)- 고전(古典) 그리스어에서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에서는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 극의 줄거리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미토스에서 떠나 로고스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표현하기 곤란한 것을 기술하기 위해(소크라테스 이전), 논리적 사색을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플라톤) 미토스의 비유적 ·직관적 표현을 자주 이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토스와 로고스를 구별하였는데, 철학은 경이(驚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미토스도 불가사의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스를 사랑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자라고 하였다(형이상학).
근세의 낭만주의 철학, 특히 F.W.셸링이나 F.W.니체는 미토스를 비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재평가하였다.
2.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노자(老子)》, 1장).
상무욕이관기묘(常無欲以觀其妙)
상유욕이관기요(常有欲以觀其요) [요:구할,경계 요]
이곳의 ‘상(常)’이란 시간의 항상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항상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無)’와 ‘유(有)’, ‘묘(妙)’와 ‘요(흯)’의 대립. 시간은 이 대립을 무너뜨린다. 시간은 바뀌는 것.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바뀌는 전화(轉化)의 틈인 것. 시간이 공간을 차지할 때 그 전화는 전위(轉位)로 바뀌는 것. 앞의 문맥은, 욕망이 ‘없으면’ 묘함을 보게 되고, 욕망이 ‘있으면’ 경계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조건의 대립인 것. 그 둘은 같은 것 [此兩者同]이다. 인지활동에서 나온 뒤 그 둘은 이름을 달리한 것[出而異名]일 뿐이다. 같음은 아득함이며[同謂之玄], 아득함이 또 아득하여[玄之又玄], 모든 아득함의 문이 될[衆妙之門] 따름이다. 상위적(相位的) 개념으로서의 ‘가(可)’와 ‘비(非)’도 또한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대립인 것. 유무상생 난이상성(有無相生 難易相成)(《노자(老子)》, 2장)이 또한 그렇다는 말이다. 상반된 개념의 전위였던 것.
대칭은 언제든지 둘이 한 쌍이 되어 태어난다. 가령 ‘꽃’을 꽃으로 본다면, 그것은 꽃 ‘아닌’쪽의 꽃을 포함한 것(꽃⊃꽃)이라는 것. 최고의 덕은 덕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上德不德, 是以有德], 부족한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덕이 없다고[下德不失德, 是以無德](《노자》, 38장) 하는 것이다. 노자는 대립을 무너뜨렸다. 나는 착한 것을 착하게 보고, 착하지 않은 것을 또한 착하게 본다.
그것이 ‘큰’ 착함인[善者 吾善之, 不善者 吾亦善之, 德善](《노자》, 49장) 것이다. 노자는 ‘유(有)’와 ‘무(無)’의 대칭을 무너뜨렸다. 천하만물은 유에서 살아가고, 유는 무에서 살아 남는다[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노자》, 40장). 있고(有) 없음(無)의 차별을 관통하는, 이른바 상위소통의 모순율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모순율에 뿌리를 내린 역설 패러독스(paradox). 이 역설은 기독교의 사유체계의 전형이었던 것. 예수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5세기 칼케돈 총회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
그와는 달리 공자의 사유체계 [(×)2]는 (×)가 (×)나름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중화의 논리구조를 드러냈던 것. ‘그것’이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다워야 한다 [(×)2]는 것.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의 의표가 그것이었다.
공자와 노자가 보여 주는 이러한 사유형식이란, 그것들의 문맥 속에는 언제든지 이원이차적(二元二次的)인 [22=4] 논리의 요원(즉 명사: 모든 명사는 개념으로 발전한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요약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거듭된’ 부정을 통해[∼(∼(∼×)] 비로소 ‘그것’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노자의 ‘명(名)’은 ‘그것(×)’을 부정하는(∼×) 단순한 대립으로의 대칭이 아니라 이원이차적인 사유의 틀(22=4)을 건너온 이름이었던 것이다[名可名 非常名 《노자》, 1장].
의미의 홑겹을 입고 떠오른 의미일지라도 그것은 그토록 결곡한 의미와의 싸움으로부터 돌아온 착상이라고 할 때, 그 착상이야말로 얼마나 황홀한 숨결을 달고 있는 것이랴. 숨결마저도 실은 불고[呼] 마심[吸]으로의 ‘상반된’ 두 측면의 통합이라는 사실. 이쪽과 저쪽은 서로 관통한다.
시인의 의식. 의식의 흐름이 어떠한 것이든, 시는 사물의 움직이는 규범(즉 조건)에 대한 순기능이라는 점에서 사물 본래의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부조리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물 쪽과 상관없이 시인의 주관, 즉 그 주관을 감싸고 있는 자발성으로서의 표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논리가 초월적 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시는 사물에 대한 시인 자신의 합리화(즉 위안)라는 점에서, 그 사물과의 일시적인(혹은, 영속적인) 간격을 인출해 내는 인식인 것. 그곳에서 그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마음의 평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희노애락의 감정에 사로잡힌 갈등의 문제였던 것. 현실에 대한 감지자의 주체적인 감응은 그토록 먼(혹은 두꺼운) 양감(量感)의 간격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 양감이란 객관화의 표상. 희노애락마저도 객관화의 표상을 통해 시인에게 감지되었던 것. 질감(質感)의 객관화[莫見乎隱, 莫顯乎微. 《중용(中庸)》, 1장]의 사유의 틀이 또한 그러했던 것. 숨기는[隱] 것보다 더 보이는 것은 없고, 극미한[微]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뜻. 이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근거를 ‘대립’에 두고 있는 말이다. 대립을 세우는 쪽은 공간이었으며, 그 대립을 허문 쪽은 시간이었던 것. 의식은 시간의 확장 혹은 수축을 재빨리 알아챈다.
그러므로 의식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변화의 비율일 따름이었다. 그렇더라도 시는 의식의 확보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시인(즉 주체)은 현실(즉 대상)과의 시중적(時中的)인 합일 혹은 분리를 통해 행복한(혹은 불행한) 감응에 휩싸일 뿐 아니라 말없는 침묵과의 접촉을 통해 ‘상분(相分)’의 논리 그 자체마저도 벗겨 낸다. 한 조각의 나뭇잎 위에 제 마음을 놓아 둔다. 그의 나뭇잎은 의식의 부호가 아니었다. 박찬일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봄이다 푸른 함박눈이 쏟아진다
하느님의 긴 은총이시다
나도 언제 함박눈으로 갚으리라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늘로 쏟아지리라
여러 색깔이 있다 푸른 함박눈이 있다
어떤 색깔로 쏟을까
나는 현재 즐거운 비명으로 산다
하느님은 죽는 걸 좋아하신다
― 〈함박눈〉 전문
‘이것 저것’ 혹은 ‘삶 죽음’이라는 상분의 논리를 앞세우고 쓰여진 시. 박찬일의 ‘하느님’은 ‘함박눈’이었다. 막연하고도 모호하게 다가오는‘하느님’의 초상(즉 상상의 각질)을 더 이상 갈등·모순·대립과도 같은 결정론적인 불가해의 표상으로 남겨둘 수 없었던 것. 초월마저도 개념이었던 그의 인식은 철저하게 해명되어야 했다. ‘예술 예술미 예술 작품’의 담론 속에 가라앉은 세계의 총체성(그것을 시인은 지금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혹은 상상의 개념으로 숙달된 존재 이해의 합목적성(다른 말로는 절대 신앙의 정신적 표상)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어투는 정신의 율법을 내려놓은 듯이 난폭해졌다(‘하느님은 죽는 걸 좋아하신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의 ‘하느님’은 감각, 즉 미의 이념으로 규정된 형식(즉 자연의 합목적성) 그것까지도 부정한 단순한 숨결(‘봄이다 푸른 함박눈이 쏟아진다’)과 제휴했던 것. 시인은 말한다. 삶에는 ‘여러 색깔이 있다’ ‘푸른 함박눈이 있다’는 것. 한쪽은 다른 쪽의 ‘남은’ 양쪽이었던 것. 물아(物我)·피차(彼此)·생사(生死)의 대립을 넘은 현존(‘나는 현재 즐거운 비명으로 산다’)에 대한 사유 형식이 그의 문맥을 관통한다.
‘죽는 걸 좋아하시는’ 하느님일지라도 생사의 대칭은 결국 ‘푸른 함박눈이 쏟아지는’ 이승의 색깔 안에 있었던 것. 눈에 보이는 자연(즉 ‘푸른 함박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정신의 실현(즉 ‘혼신의 힘’), 그 두 영역을 그는 하나로 봉합해 놓았던 것. 진리는 진리일수록 그의 적대였다. 시인의 상상은 ‘현존하는’ 사물의 형태를 정신에 연결시킴으로써 진리의 자발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묻고 있었던 것.
진리일지라도 그것들은 상상의 형태를 입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내면화된 종교적 상상의 관습이 그의 시의 적수였던 것이다. 시적 표현의 표면이 아닌 이상,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성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키는 꿈이었던 것.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찬일 시의 사물의 형태는 그의 삶의 실제 깊이보다도 훨씬 깊었던 것. 가령, 어떤 신이 끝끝내 영험하려고만 한다면 그 신은 곧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神無以靈, 將恐歇. 《노자》, 39장]. 그의 시에 있어서는 신은 헐값이어도 좋았던 것이다.
3.
‘나’를 나라고 인정하면 ‘아상(我相)’에 빠진다. ‘너’를 너라고 인정하면 ‘인상(人相)’에 빠진다. ‘그’를 그라고 인정하면 ‘중생상(衆生相)’에 빠진다. ‘영원’을 영원이라고 인정하면 ‘수자상(壽者相)’에 빠진다. 《금강경(金剛經)》에 나오는 사상(四相)에 관한 석가의 가르침이다.
이 경우의 ‘상(相)’은 ‘색(色)’이며, ‘색(色)’으로서의 명사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가변적인 변수(×)의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래(如來)의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가(可)’와 ‘비(非)’의 속령에 갇힌 패러다임일 뿐이다. ‘가(可)’는 ‘가(可)’로서 머물지 않고 언제나 그것의 대칭인 ‘비(非)’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심물일원(心物一元)의 진정한 ‘공(空)’을 꿈꾸는 입장에서는, 명사와 동사로 변주되는 먼지의 이동[色·聲·香·味·觸·法·空]에 집착하지 않는다. 먼지는 이동한다(즉 변화한다). 《금강경》 제13품에서 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보리. 제미진, 여래설비미진, 시명미진. 여래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여래는, 모든 먼지를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먼지이며,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것의 이름이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라[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卽非菩薩. 《금강경》, 제17품]는 것. 청정의 세계. 그러나 그 청정의 일면에 집착하게 된다면, 일면은 ‘단순한’ 이름일 뿐이므로 그것이 번뇌의 뿌리라는 것이다.
‘먼지’를 먼지라고 부르는 이름. 번뇌가 보리(菩提)라는 역설은 이곳에서 나온다. 변수(×)는 역설의 변역(變域)을 낳았고[그것은 ‘참’이며, 동시에 ‘거짓’이다: ∼(p∼p)], 수대(隋代)의 길장(吉藏, 549∼623)에 이르러서는 이원삼차의 사유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길장의 이제상즉론(二諦相卽論): 첫째 마디는 ‘유(有)’와 ‘무(無)’의 양립, 둘째 마디는 ‘유·무’와 ‘∼유·∼무’의 병립, 셋째 마디는 ‘유·무’와 ‘∼유·∼무’와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의 연립으로 나타나며, 이 단계를 모두 밟으면 16마디[23+1=24=16]로 포개진다. 의식의 대상, 즉 이름은 ‘진(眞)’이 아니므로 ‘비이비불이’의 마지막 단계를 넘은 다음에라야 비로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편비중(非遍非中)의 평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유’(×)의 이중부정(∼(∼×))인 ‘비이(非二)’와 ‘무’의 이중부정(∼(∼(∼×))인 ‘비불이(非不二)’는 결국 ‘유’와 ‘무’의 대립에 그 뿌리를 두었던 것. 이중부정은 긍정이었던 것. 번뇌가 보리라는 역설은 바로 이 대긍정, 즉 공간 전체를 둘(二)로 나누는 부정(∼×)에 의한 이분화였던 것.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서랴[法尙應捨, 何況非法, 《금강경》, 제6품]. 이 대긍정은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所謂佛法者, 卽非佛法, 《금강경》, 제8품]라는 말을 낳기에 이른다. 대긍정은 언제나 ‘그것’(×)이 ‘그렇다’(可)로부터 ‘그렇지 않다’(非)로 전이되는, 말하자면 부정에 의한 이분화의 끝에 있었던 것이다.
공간의 이분화가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간의 이분화는 시간의 부정(∼×), 즉 시간의 소멸로 이어지는 재분화로 모든 의식이 끊어지게 된다. 망각의 망각이 그것이다. ‘그것’(×)을 망각한(쬎) 것(쬎·(×))조차 다시 망각해 버림(쬎·(쬎·(×)))으로써 모든 집착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色)은 그것의 반대편 저쪽에 ‘저것’(저것 또한 ‘다른’ 색일 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망각’(空)이 붙어 있었던 것. ‘그것’의 또 다른 ‘저것’은 ‘그것’의 상위적 대립이 아닌 미몽에 불과했던 것.
상위적 대립의 황홀한 불꽃.‘유’(즉 ‘色’)와 ‘무’(즉 ‘空’)를 한꺼번에 끌어안고,‘가(可)’(즉 ‘그렇다’)와 ‘비(非)’(즉 ‘그렇지 않다’)를 한꺼번에 끌어안을 때, 그때가 여여(如如)한 시간이라는 것. 따지고 보면, 본 모습이란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그것’이 본 모습이었던 것. 본 모습으로서의 ‘그것’은, 그것이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점에서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숨결을 달고 있는 것이었다.(이 글의 변수의 변역(變域)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은 나의 스승 한태동 박사의 《사유의 흐름》(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에 전거한 것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도가의 무명론(無名論)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취관지, 인기소연이연지, 즉만물막불연, 인기소비이비지, 즉만물막불비(以趣觀之, 因其所然而然之, 則萬物莫不然, 因其所非而非之, 則萬物莫不非) [趣:뜻, 마음 갈 취]
― 《장자(莊子)》, 〈추수(秋水)〉
이는 ‘형명(形名)’의 기능을 더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정한 의취로 바라볼 때, 무엇을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에 그렇지 않은 것은 없고, 무엇을 그렇지 않게 봄으로써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물에 그렇지 아니함이 아닌 것도 없다는 것. 객관은 모르는 ‘그것’일 뿐이다. 이취관지(以趣觀之), 그것이 문제였던 것. 편파(偏頗). 그러기에 장자는 ‘양망(兩忘)’이라는 인식의 궁극을 꿈꾸었던 것. 그의 양망은 형상이 없는 형상, 사물이 아닌 사물의 집합, 즉 미분화의 함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분별의 대립을 넘은 곳에 그의 양망이 있었던 것.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는 결국 뜻이 아닌 소리에 가까워야 하는 것. 음악으로서의. 김백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목련이 돋아나고
산수유가 피어나고
벚꽃이 불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봄이 무서워졌다
겨울이 히말라야 만년설처럼 녹지 않는 마음인 줄 알았더니
눈물을 흘리는 눈사람처럼
시간이 저절로 녹아서 나무들의 뿌리와 줄기로 흘러가더니
희고 노랗고 붉은 횃불을 든
이 모든 꽃들의 혁명이 무서워졌다
그 미묘한 신호와 암시에 중독된 검은 운명의 인생보다도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겨울이면서 봄이면서 여름이면서 가을인 당신
나무이면서 꽃이면서 잎이면서 열매인 당신
꽃들의 환한 시간 속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당신
― 〈횃불〉 전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인은 지금 부처의 눈을 뜨고 있다. 그의 꽃과 나무는 만다라의 꽃과 나무. 시인은 꽃을 보고 흥분한 내막을 이렇게 실토한다: ‘시간이 저절로 녹아서 나무들의 뿌리와 줄기로 흘러가더니’라고. 언제든지 아무 데나 녹아 흐르는 시간은, 그 시간의 일상적인 피투성(被投性) 안에 만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로 인한 두려움(‘무서움’)은 존재의 부담을 촉발시킴으로써 명랑한 기분을 빼앗기 일쑤인 것이다.
김백겸 시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존재의 피투성에 대한 노여움 혹은 두려움을 버리지 않고, 버리기는커녕 적극적인 표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항상 고양된 기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의 수사학적 정감에 나타난 가장 확실한 공적은 세계 내부의 불충분한 존재 형식에 관한 섭섭함 대신 그것과는 다른 어떤 지고자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준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간은, 이상한 일인데, 시간 속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정신의 표상이었던 것. ‘겨울이면서 봄이면서 여름이면서 가을인’ 시간. ‘나무이면서 꽃이면서 잎이면서 열매인’ 공간.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와 같은 시간의 비통속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시선 때문이었다. 통속은 야만이었지만, 본질적인 초월의 계기였던 것. 아름다움은 개념인 동시에 내가 있어야 할 진리의 존재론적 범주였던 것. 시간의 부표를 떠밀고 올라온 ‘당신’은 이때부터 시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달구어 놓는다.
그의 ‘당신’은,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먼지(즉 ‘꽃들의 환한 시간’)로부터 얼굴을 들고 나타난 반야(般若)였던 것. 반야는 반야가 아니었던 것. 김백겸은 지금 그 반야, ‘유(有) 공(空)’을 뛰어넘는 그 반야를 부르고 있었던 것. 그가 말하는 ‘꽃들의 혁명’은 비공비유(非空非有)의 ‘횃불‘로 타오르는 춤이었던 것. 먼지의 춤이었던 것. 그의 말대로라면 그 먼지의 춤이 ‘무서웠던’ 것이다.
4.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유가·도가·불가의 사유 형식에 관한 일별을 통해 침묵의 공간을 꽤나 신명나게 바라보았다. 침묵의 하중은 매우 무거운 것. 나는 어떤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시는 시간(즉 의식)의 확대가 아닌 공간(즉 호흡)의 확대다. 시는 침묵의 공간을 따라간다. 침묵의 공간이란, 안으로는 의식의 지평을 쳐다보는 간격을 두고 하는 말이며, 밖으로는 사물의 지평을 열어 놓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물이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닌 부분에 대한 시인의 명상. 시인은 사물의 지평, 즉 사물의 ‘열린’ 공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시를 쓴다. 사물은 ‘없다’. 사물은 사물 하나하나의 개별로 머물지 않고 언제나 다른 세계의 연관과 더불어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사물성의 깊이(즉 세계이해의 바탕)로 침투한 낱말을 가지고 시인은 시를 쓴다. 이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전(現前)과 부재의 맞물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대응. 침묵. 침묵은 부재로서의 침묵이 아닌 ‘살아 있는’ 현전으로서의 침묵이었던 것. 사물의 지평을 열고 닫는 문턱이었던 것.
침묵의 간격은 비좁지 않았다. 예감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침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전망의 소실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또 다른 지속을 연결하는 도약이라는 점에서 허공을 지운다. 허공은 공간이 아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종교적 상상의 입김에 닿은 권태의 대극(對極)이었던 것. 아무 때나 궁극이었던 것. 궁극이란 ‘지금 여기’로서의 입을 열고 혹은 입을 닫는 주관의 탈자적 지평이었던 것.
대개의 경우, 시인의 관점들 역시 따지고 보면 이 궁극의 문전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눌변이었다. 침묵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시인이 시를 쓸 때, 그는 종교적 상상의 어떤 연관에게도 허리를 구부릴 수 없는 것. 구부려서는 안 되는 것. 바람이 달밤을 그냥 지나가듯이 그는 시를 쓰는 것. 우대식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저인망 그물에 걸린 고래가 죽었다
溺死다
그의 몸에 남은 망사 스타킹 같은 그물자국에서
線에 관한 몇 개의 보고서를 읽는다
倫理學이 아니다
생의 近親인 죽음 앞에서
물에 빠져 죽은 고래에 대한 내 명상이 깊어질 때,
詩에 대해 생각해본 것뿐이다
말(言)의 촘촘한 저인망에 걸려 죽어가는
한 시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진정한 죽음이란
저와 가장 친근한 곳에서 완성되는 법
客死를 면한 고래와 시인
― 〈고래와 시인〉 전문
‘고래가 죽었다’는 것. 죽음은 죽음인데, 고래의 죽음이 익사였다는 것. 물에 빠져 죽은 고래의 죽음은, 그러므로 몹시 부자연스럽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 저와 같은 죽음의 모습을 염두에 둘 때, ‘말의 촘촘한 저인망에 걸린’ 시인의 죽음 그것까지도 실은 익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시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의 원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의 형태에 대한 불안이었던 것이다. 형태가 본색이었던 것. 죽음의 형식이 죽음의 본질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 이러한 관점은 그의 죽음에 대한 명상을 훨씬 진지하게 이끄는 백미라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시인이 꿈꾸는 ‘진정한’ 죽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죽음의 죽음이었던 것. 그 동안은 죽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 죽음을 ‘선(線)’이라고 말한 시인의 암호는 그러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 관한 한 삶의 크기의 역비(逆比, 즉 ‘생의 近親인 죽음’)를 보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까지도 미추의 문제였던 것. 아름답지 않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다. 이쯤 되면, 한 순간의 죽음을 발굴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빛은 종교가 아닌 산술(算術)의 그것일 터.
의미는 사실의 후면에 있었던 것. 그러기에 시는 아직도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객관(사물 자체에 붙어 있는 말)을 건너뛴다. 약속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종교적 상상과 문학이 서로 뒤섞여도 좋은 부분이며, 혹은 의미 효과로 볼 때 상상의 지평을 넓히는 경우, 문학은 종교가 종교를 해체하는 비판적 변증론의 해법에 따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교를 품는 상상은 종교를 버리는 상상보다 늘 비좁기 때문.
지금까지의 상상은 사물의 존재 조건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 시인이 시인인 이상, 그는 상상과 앎의 편차를 달리 숨기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관한 인식론적인 감각은 그것까지도 실은 자신의 삶의 형태를 노후하게 만드는 관습이라는 것. 종교는 늘 부패했던 것. 시인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닌, 공학이었던 것. ■
안수환
현재 천안연암대학 교수. 시집에 《소심한 시간》 외 다수가 있으며 시론집 《우리시 천천히 읽기》 등이 있다.
[유심]
추천3
댓글목록
이월란님의 댓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님의 댓글
공부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법문 박태원님의 댓글
법문 박태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단한 존재론의 설파라는 것
유무를 끌어안는 無住의 사물 자체가 시라는 것
名色이 滅하면 識이 멸하고 識이 멸하면 行이 멸하여 무명이 사라지고
대자유를 얻는다는 것
언어에 익사하는 시인이 되지 않으려면
언어는 無實無虛하니 존재는 말해도 그것이고 침묵해도 그것이라는 것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